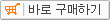맹자가 달아난 자리에 ‘경제’가 남았다
관자
김필수 외 옮김 | 소나무 | 1062쪽 | 양장 5만원, 보급판 3만8000원
유석재기자 karma@chosun.com
입력 : 2007.01.05 21:56
- 관자(管子)가 누구인가? 바로 고사성어 ‘관포지교(管鮑之交)’에 등장하는 관중(管仲). 기원전 7세기 중국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환공(桓公)을 도와 부국강병과 패업을 이룬 정치가다. ‘관자’는 그의 사상을 담았다고 여겨졌던 고서(古書)다. 200년쯤 뒤의 공자가 ‘논어’에서 “관중의 그릇이 작다”고 말했듯, 유가의 정치사상과는 상당히 이질적이면서 긴장 관계를 이루는 존재로 인식돼 왔다. 수많은 중국철학사 책에서 그는 법가(法家)의 시조였다.
그렇다면 이 책은 관중이 쓴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의 이름을 빌려 왔을 뿐, 실은 400년쯤 뒤인 전국시대 제나라 직하학궁(稷下學宮)의 학자들이 편찬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카데미아에 비견될 만한 직하학궁은 다양한 부류의 학자들을 불러모아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전국시대를 제자백가 사상의 꽃이 화려하게 필 수 있었던 시대로 만드는 데 일조했고, 위정자들은 그들에게 현실 정치의 ‘실용적’방안을 요구했다. 그걸 못 견디고 떠난 사람이 맹자였다.
그 때문에 ‘관자’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법가를 토대로 하면서도 유가·도가·음양가의 시각들이 책 이곳저곳에 혼재돼 있다는 것. ‘여씨춘추’와 함께 실로 고대 동양사상을 망라한 종합 사상서다. “곳간이 충실해야 예절을 안다(倉?實而知禮節)”는 이 책의 유명한 말이 분명 법가적이면서도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도 있다(有恒産有恒心)’는 유가의 격언과 통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제왕학(帝王學)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할 만큼 매우 실용적이면서 구체적인 정치와 경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국가 정책의 수립, 경제 운용 원리와 물가 조절 정책까지 아주 폭넓다. “상(賞)을 쓰는 자는 믿음을 귀히 여기고 형(刑)을 쓰는 자는 반드시 한다는 것을 귀히 여긴다”는 철저한 법치주의를 보여주는데, 일본 학자 가노 나오키(狩野直喜) 같은 사람들이 “관자가 법을 중시한 목적은 부강(富强)으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듯이 무게를 두고 있는 분야는 결국 경제다.
하지만 “조선조 지식인들이 ‘맹자’가 아니라 실용적인 ‘관자’를 읽었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번역본 서문의 탄식은 온당치 않다. 여러 사상에서 정수를 뽑아낸 잡가(雜家)류의 얘기가 좋은 말로 들리는 것은 당연하며, 인문서를 읽는 사람에게 ‘너는 왜 아까운 시간에 실용서를 읽지 않느냐’고 질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결코 이 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사농공상(士農工商)’ ‘예의염치(禮義廉恥)’ ‘목민(牧民)’ 같은 말들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원전은 분명 역사학·철학·정치학·법학을 아우른 대표적인 동양고전 중 하나다. 하지만 이 번역본은 이제서야 처음으로 나온 우리말 완역본이라는 데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함축적인 문장인 ‘왕자부지 내자불극(往者不至來者不極·가는 것이 미치지 못하면 오는 것도 극진하지 않다)’을 “군주가 백성에게 은덕을 베풀지 않으면 백성도 희생하며 봉사하지 않는다”로 번역하는 데서 보듯 의역이 너무 지나친데다, 주석이 백화문 번역본의 풀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CEO가 읽어야 할 경세의 바이블” 운운한 책 표지의 카피도 좀 안쓰럽다.
'偉人*人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희제 [康熙帝] (1) (0) | 2007.01.15 |
|---|---|
| 카이사르 (0) | 2007.01.14 |
| 늙은 말과 개미에서 지혜를 얻은 제의 명재상 관중 (0) | 2007.01.07 |
| 제 환공과 맥구읍인..."주군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0) | 2007.01.07 |
| 재상의 갈등을 지혜롭게 푼 측전무후 (0) | 2007.01.07 |